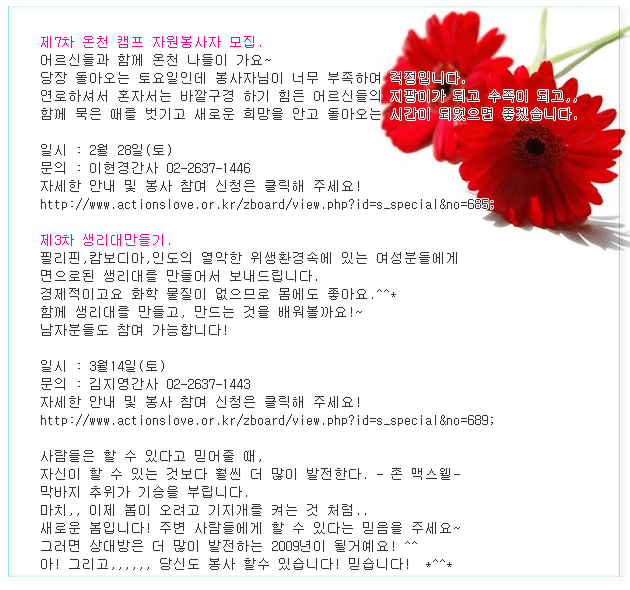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스볜낼坪?어울려 살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덜했고, 가급적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전통사회는 가족을 단위로 살아가는 가족사회였다. 당시 가족은 생산과 소비의 단위이자, 사회활동과 교류의 단위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예컨대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등 이른바 ‘환과고독鰥寡孤獨’에 대한 부양을 가족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마찬가지 장애인 복지정책도 ‘가족부양’을 원칙으로 삼은 채, 해당 가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가족한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웃이나 친척 등 마을공동체에서 지원해주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족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마냥 수수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다. 전통시대 장애인 복지정책도 현대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조선의 장애인 지원 정책
조선 정부는 장애인을 ‘자립 가능한 사람’과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나누어 지원정책을 펼쳤다. 예컨대 정종 2년(1400) 7월, 임금이 정전에 나아가 이렇게 지시한다.
“환과고독과 노유老幼, 폐질자(장애인) 가운데 산업이 있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는 소재지 관아에서 우선적으로 진휼하여 살 곳을 잃지 말게 하라.”
먼저 자립 가능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소경, 봉사, 맹인 등으로 불린 시각장애인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들은 주로 안마 같은 업종에만 종사하지만, 전통사회에선 점占을 치는 점복, 경經을 읽어 질병을 치료하는 독경,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같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자립, 곧 스스로 먹고 살았다(이들 직업은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대우 받는 직업이었다).
특히 정부는 그들 시각장애인을 위해 따로 명과학이나 관현맹인 같은 관직제도를 두어 정기적으로 녹봉과 품계를 올려주었다. 또 우리나라엔 지금으로부터 벌써 6백년 전인 태종, 세종 때에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인 명통시明通寺가 있었는데, 이는 서울 5부의 시각장애인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였다. 명통시는 조선 정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립한 것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엄연한 공적기관이었다.
다음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은 거동이 힘든 각종 중증장애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구휼이나 진휼, 진제 등의 명목으로 국가에서 직접 구제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고대로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당시 임금들은 왕위에 오를 때나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려울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주 환과고독과 함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도록 신하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조세와 부역 및 잡역을 면제하고, 죄를 범하면 형벌을 가하지 않고 포布로써 대신 받았으며, 연좌죄에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시정侍丁, 곧 부양자를 제공했고, 때때로 노인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주며 쌀과 고기 같은 생필품을 하사했다. 기타 동서활인원이나 제생원 같은 구휼기관을 설치하여 위기에 처한 장애인을 구제하였다.
이렇게 장애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체 내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했기 때문인지, 뚜렷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회에 공헌한 장애인들이 매우 많았다. 대표적으로 세종 때 우의정과 좌의정(오늘날 국무총리격)을 지낸 허조는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른바 곱추)이었고, 숙종 때 우의정이었던 윤지완은 한쪽 다리를 절단한 지체장애인이었으며, 연암 박지원의 작품 <허생전>에서 주인공 허생이 꼽은 17세기 대학자 졸수재 조성기 역시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었다. 이밖에 18세기 화가 최북이나 조선 중기의 음악가 김운란 등 장애인 예술가도 대단히 많았다.
전통시대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당시엔 장애인이라 하여 천대받지 않았고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이 주어졌으며, 양반층의 경우엔 과거를 보아 높은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다. 나아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때때로 이름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즉, 그들은 엄연한 사회의 한 일원이었던 것이다.
▶글·사진_ 정창권 고려대 국문학과 강사